|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 진짜자아
- 하나님의질서
- 육휴맘
- 한달브런치작가되기
- 거룩한예전
- 언더우먼4기
- 브런치작가도전하기
- 언더우먼4기 #시장분석 #SOM #SAM #TAM
- 일상이안전한사회
- 여성사회혁신창업
- 3040여성
- 기억은힘이세지
- 티시해리슨워런
- 워킹맘 #직장맘 #육아휴직 #마미트랙
- 언더우먼4기 #MVP #PMF #언더독스 #창업가의딜레마
- 나만의키워드
- 스토리살롱
- 한달어스 #한달브런치작가도전하기
- 레퍼런서
- 416재단
- 언더우먼4기 #창업준비 #창업아이템 #페르소나 #엄마창업가 #관점도출
- 언더우먼4기 #창업교육 #창업아이템
- 숲속의자본주의자
- 창고살롱
- 오늘이라는예배
- 한달브런치작가도전하기
- 존오트버그
- 커리어사춘기
- 사소한하루
- 한달어스
- Today
- Total
Eat, Pray, Grow
복직 첫 달 현타 맞은 이유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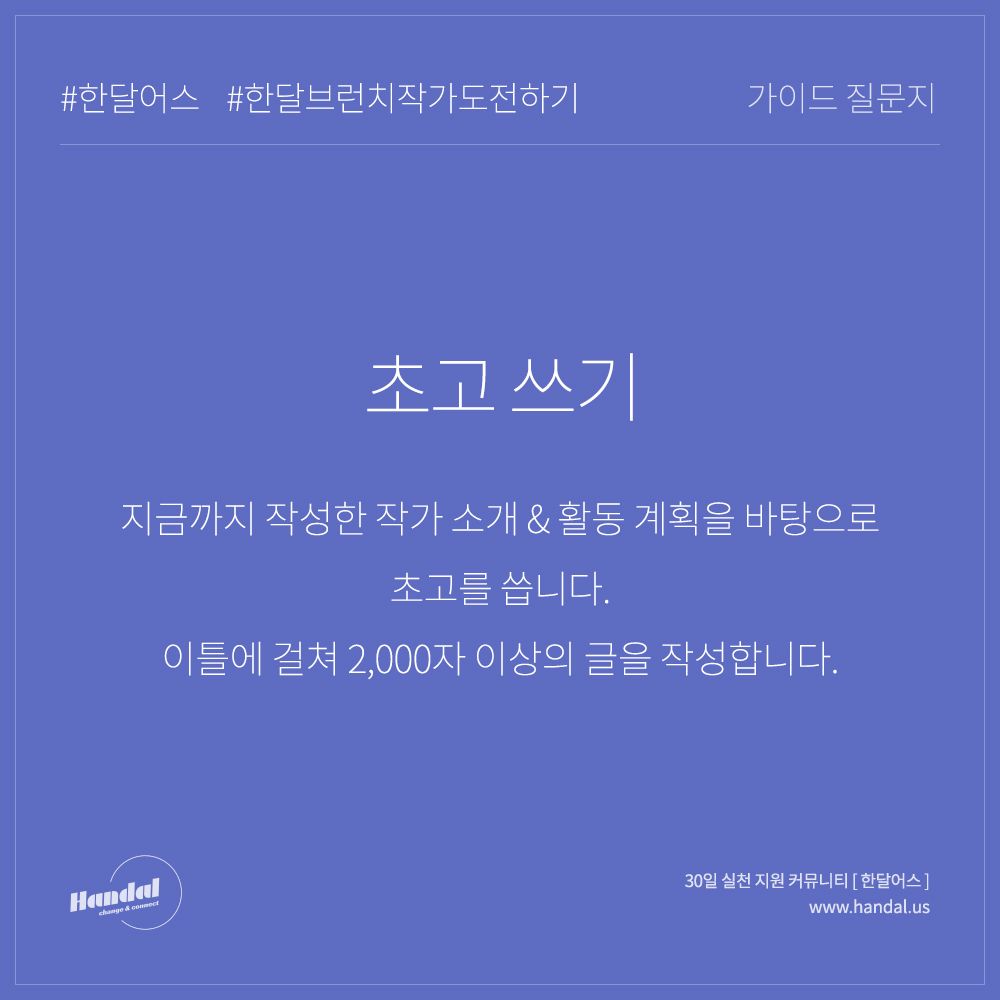
"모유 수유 언제까지 할 건데?"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
"끝나면 바로 알려줘. 그날 바로 술 먹여 줄게."
육아휴직이 끝나고 업무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어 실 회식 자리가 있었다. 원래도 술을 마시지 않았던 나는 돌쟁이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술을 강권하는 분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고 있는 차였다. 그런데 자리를 옮겨 다니며 폭탄주를 마시고 있던 실장님이 혀 꼬인 말투로 이런 멘트를 날리는 게 아닌가. 오늘은 그냥 넘어 가지만 다음에는 각오하라는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그 말에 간담이 서늘해졌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같은 여성이고,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인데도 모유 수유 중인 아랫 직원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걸 몹시도 못마땅해하다니.그 후 모유 수유를 6개월이나 더 하고 끊었지만, 난 이제 꼼짝없이 잡히겠구나 생각하며 한 동안 그 사실을 숨기고 다녔다.
복직 초반에는 회사 출근길이 참 행복했다. 언제나 딱 붙어있던 껌딱지를 떼로 나 홀로 가벼이 지하철에 몸을 싣고 어디론가 갈 수 있다는 사실. 거기다 좋아하는 책도 보면서 말이다. 또 사무실에서는 차를 마시며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내 자리가 있지 않냐 말이다. 이렇게 혼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처음 해보는 영업 업무에, 매출에 대한 압박이 작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내 일, 내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숨통을 틔워 줬던 것 같다. 회사에 오면 내가 아이를 낳고 온 엄마인지도 까먹을 만큼 일에 집중하면서, 또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내 이름으로 불리면서 잃었던 나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휴직 기간에는 싱크대 앞에 서서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도 힘들었는데 복귀 후엔 앉아서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감격스러웠다. 나는 전업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뼈저리게 느꼈던, 지극히 외롭고 자존감 제로 상태였던 휴직 기간이 끝나고 마침내 직장인 모드로 돌아오면서 내 삶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집에 가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지만 회사에서는 출산 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마케팅팀 직원으로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복직 후 얼마 안 되어 있었던 실 회식에서 비로소 나는 직장맘이 되었음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실장님의 비정하고도 비장한 멘트뿐 아니라 또 하나 뜨악했던 건 바로 퉁퉁 불다 못해 돌처럼 딱딱해진 가슴이었다. 워낙 모유 양이 적어 퇴근하고 돌아오면 수유패드가 약간 축축하게 새어 나온 정도였다. 잘 준비를 하고 아이에게 물리면 꿀떡꿀떡 배불리 먹고 잠이 들곤 했다. 하지만 그날 밤늦게까지 젖을 빨리지 못한 내 가슴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살짝 닿기만 해도 악 소리가 날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 유축조차 하기 힘들 만큼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젖을 기다리다 지쳐 잠든 아이가 어서 빨리 깨주기만을 바랐던 기억이 난다.
아~ 이것이 직장맘의 현실이구나. 마치 엄마가 아닌 듯 싱글 코스프레를 하며 늦게까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내 몸은, 내 가슴은 그 꼴을 도저히 봐주질 않았다. 빨리 가서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냐는 듯, 무정한 가슴은 욱신거리며 나에게 화를 내곤 했다. 물론 복직 전 모유수유를 끊어버리면 간단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이를 두고 출근하는 미안함을 밤에 들어가서 수유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된다면 마음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았다. 아이를 처가에 맡겨 놓고 주말에만 본다는 동료 직원은 아내가 일주일 치 유축한 모유를 얼려서 고속버스 택배로 보낸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나는 집에 가서 밤에 물리는 게 뭐 어렵다고 그것마저 끊겠냐 말이다. 할 수 있는 날까지는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난 처음으로 내가 이제는 그냥 보통의 직장인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회식 때 모유 수유한다고 술을 못 마시면 못마땅한 직원이 되고, 가슴이 터져 버릴 듯 퉁퉁 불어도 티를 낼 수 없는 엄마인 직장인이 된 거였다. 그때서야 나보다 먼저 출산을 하고 돌아온 같은 팀 동료가 그런 말을 했던 게 이해가 갔다.
"야근을 너무 하고 싶어요. 쪼금만 더 일하고 가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하고 후다닥 정리해야 하니 넘 아쉬워요."
야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서러움. 본의 아니게 칼퇴근을 하면서 일이 밀리는 상황에도 눈물을 머금고 육아 출근을 해야 하는, 상상도 못 했던 직장맘의 생활이 나에게도 시작된 것이다. 이후 마미 트랙으로 서서히 궤도를 이탈한 내 모습을 발견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다.
5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육아휴직을 하면서 다가올 복직을 생각하니 이제는 터울 많은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첫째 때는 닥친 현실에 정신없이 몸을 맡긴 채 살아갔다면 모든 걸 알면서도 또다시 백조처럼 겉으론 우아한 척하며 물 밑으론 쉼 없이 발버둥치는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니 말이다. 하지만 어쩌랴. 우리 시대 일하는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삶이지만 가끔 너무나도 서럽고 억울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조금은 덜 고달픈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본다.
'일상 단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그렇게 햇님이를 떠나 보냈다 (0) | 2021.04.12 |
|---|---|
| 퇴사 준비는 곧 나를 찾는 과정 (0) | 2021.04.08 |
| 그냥 좋은 글 (0) | 2021.04.05 |
| 준비된 작가 (0) | 2021.04.03 |
| 솔직한 글의 힘 (2) | 2021.04.02 |




